<이원호의 경제톡> 중국 과잉생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해야
2024-12-23
특히 그동안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직접 발표할 정도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을 자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뼈아프다. 두 눈 부릅뜨고도 도둑을 막지 못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부터 ‘내부통제 혁신'이 사실상 말만 번드르르한 헛구호에 그쳤거나, 근본적으로 내부 일탈을 통제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은행 구성원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는 더욱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
지난해 '7만달러 횡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미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취임 3개월차, 서슬퍼런 신임 회장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업계의 반응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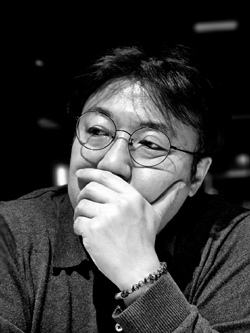
더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해 횡령범죄를 저지른 이번 직원은 전결권이 없는 대리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직원이 마치 제 돈처럼 무려 100억원을 횡령해 사적 투자에 탕진했다는 이야기다.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기 힘든 사고다.
이번 사건은 임 회장에 대한 물음표를 낳고 있다. 임 회장은 낙하산, 코드인사 논란에도 우리금융 사형탑에 올랐지만 ‘명가 재건’을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잦은 횡령사고로 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1분기 성적도 낙제점이다. 그가 올해 신년사에서 경영 목표를 내세운 ‘선도 금융그룹 도약'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사고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지난해 국감에선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임 회장은 소환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진 만큼 올해는 임 회장을 불러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 우리은행 측은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금융권 제갈량’으로 불렸던 임 회장 역시 왜 자신이 우리금융 회장으로 일해야하는 지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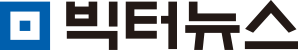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